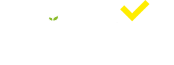|
[정의당 Story]는 한 갑자를 돌아 61회로 지난 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제 정의당의 전사로, [진보정당 Story]를 39회를 예정으로 연재한다. 1990년대 초반의 민중당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겠지만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62회 <진보정당 Story>의 주제는 1996년 12월에서 97년 1월로 이어진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총파업 투쟁’과 ‘국민승리21’로 잡았다.
|
62.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꿈, 진보정당 건설
: ‘민주노동당’ 건설의 배경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7월,8월,9월 노동자 대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던 노동자들이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억압체제가 이완된 틈으로 마치 마그마가 치솟듯 끓어오르며 억압체제의 얇은 지각을 뚫고 분출한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광범위한 사회변혁으로 이어졌다. 전노협, 전농, 전교조, 전빈련, 전대협 등 다양한 사회계급, 계층이 조직되었고, 여소야대의 정당 정치가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한겨레신문과 같은 국민주 신문이 탄생하면서 언론환경도 바뀌었고, 지체되긴 했지만 지방자치제도 부활했다.
하여간 6월 민주항쟁은 가히 시민혁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항쟁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를 바꾸어놓았다. 이렇게 형성된 정치사회체제를 우리는 ‘87년체제’라고 불렀다. 6월 항쟁을 사회 전반의 변혁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시민사회의 조직화,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화 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89년의 노조 조직율은 19.8%를 기록할 정도로 노조 결성 붐이 식지 않고 이어졌다. 국가의 폭압에 눌려 왔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자각이 노동조합이라는 시민사회의 진지가 구축되면서 비가역적인 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노조운동의 폭발을 보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전위들은 ‘민중당’, ‘통합민중당’ 창당 등 정치적 조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향후 건설될 진보정당의 든든한 기초가 축성되고 있는 것이기는 했으나, 애석하게도 대중운동은 곧바로 진보정당 건설과 연결되지는 못했다.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은 그 후 10년이 지체되었다.
서구의 진보정당들이 건설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계기를 사회적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건설은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의 계기도 놓치고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분단체제라는 대중적 좌파정당이 자리 잡기 힘든 조건과 함께, 재야운동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여전히 진보정당의 시기상조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적 진보정당은 ‘미래’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을 조직할 정도로 커졌고, 외환위기라는 자본주의의 쓴맛을 보았으며, 민주화 이후 전후 세대가 사회의 중핵을 차지하며 레드 콤플렉스가 희석되고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진보정당의 건설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1997년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었고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승리21’ 결성의 동력은 1996년 12월에서 97년 1월로 이어진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총파업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역사상 유일하게 ‘총파업(제네스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총파업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을 무효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입법부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진보정당이 없는 탓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를 완전히 철회시키지는 못했다. 97년 3월 노동법이 재개정되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의를 모았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노조 간부나 지식인 수준에서 거론되는 말이었으나 97년 이후부터는 조합원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말이 되었다.
물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이미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체제가 공고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제3 정당으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9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반에 불과한 30만 6026표, 1.2% 득표에 그쳤다.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에 실망한 일부는 국민승리21을 떠났으나 울산과 창원, 거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확인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은 진보정당 건설의 꿈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직을 던지고 국민승리21을 기반으로 진보정당 건설에 매진했다.